국내 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격파괴 마케팅이 성황리에 벌어지고 있어 일부 점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1500원 짜리 국수 가게, 1900원 짜리 돈가스 가게 등 저렴한 단가로 무장한 점포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10년 전 모습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
지난 98년 IMF 당시에도 1인분에 1800원짜리 삼겹살이나 2900원짜리 냉면집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었다.
10년 전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한 끼 식사로 국한됐던 양상을 벗어나 테이크아웃 커피 등 음식업 전체 분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아이템이 커피다. 값이 저렴한 1500~2000원 짜리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다니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가격파괴 마케팅은 국내 경기가 당분간 호전될 기미가 없다는 현재 사정을 감안하면 들불처럼 확산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가격파괴 마케팅이 지닌 여러 가지 단점들이다. 가장 큰 단점은 주변 상권을 망가뜨린다는 것. 때문에 가격파괴 점포가 입점하면 주변 점주들은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고.
부산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가격 파괴점이 들어와 한동안 바글바글 하더니 미성년자까지 받아가며 뽑을 거 다 뽑고 3개월 만에 철수하더라”며 “그 3개월은 인내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시간들”이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곱게 철수하면 좋은데 그 점포가 빠진 뒤로 한동안 고객들의 상권 접근 자체가 줄어들더라”며 “3개월을 못 버티고 사라진 경쟁점포 수도 꽤 된다”고 털어놨다.
서울 강남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B씨는 “단가를 낮추면 어쩔 수 없이 서비스가 소홀해진다”고 지적한 뒤 “이런 매장들은 대부분 상도를 어기기 마련”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가격 파괴 전문점에 대항하는 방법은 고급 서비스와 이벤트를 통해 수준을 차별화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점주는 “가격파괴 마케팅은 암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모르핀을 투여하는 것처럼 최후의 판매 전략이 아닌가 싶다”며 “가격파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점주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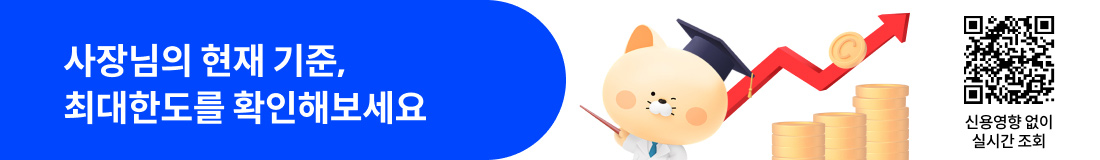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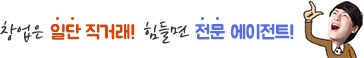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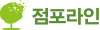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