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어렵다 vs 차별화로 극복 가능
커피문화 확산에 힘입어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떠오른 커피전문점. 요즘도 소규모 자본으로 손쉽게 차릴 수 있는 장점에 끌려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의 속도가 빨라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반면, 아직은 성장여력이 남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어디서든 커피전문점을 쉽게 볼 수 있다. 다양한 커피전문점 로고가 새겨진 종이컵을 든 사람들도 쉴 새 없이 마주친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식당+커피전문점’이 공식화되기까지 했다. 가히 ‘커피전문점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한 풍경이다.
시장조사업체 AC닐슨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규모는 2007년 1조5천500억 원에서 2012년 4조1천300억 원으로 5년 만에 2.7배 커졌다. 커피전문점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지적이 좀 더 우세한 가운데, 아직 성장여력이 남았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포화 징조 곳곳에
커피전문점은 높은 마진율과 운영 편리성, 커피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2007년부터 급격히 성장했다. 업계는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커피전문점(자영업 포함)이 2만 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잇따른 시장진입에다 개인의 창업 열기가 합세하면서 한집 건너 커피전문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대로변이나 번화가에 가보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사이사이 소규모의 개인 커피전문점까지 자리 잡은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커피소비자는 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결국 수익성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고육지책으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커피전문점들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에만 170곳 이상인데 작년에 비해 80% 정도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1년 만에 매출이 반 토막 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임대료를 내지 못해 망하는 커피점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경우에 더욱 사정이 안 좋다. 임대료, 인건비, 본사 가맹비 등을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건지는 수익은 쥐꼬리만큼이기 십상이다. 애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수익률은 아주 목 좋은 곳이 아니라면 실현이 불가능한 수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익률과 창업비용 등을 거짓 또는 과장으로 광고한 이디야, 할리스, 더카페, 다빈치,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 등 12곳의 프랜차이즈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점포라인의 조사결과 지난해 3~4월 서울 소재 커피전문점의 평균 권리금은 1억4천535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의 1억6천590만 원에서 12.4% 하락한 것이다. 상가 시장에서 성수기로 통하는 3~4월에 커피전문점 권리금이 2천만 원 이상 떨어진 것은 점포라인이 통계산출을 시작한 2008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중국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2년 새 중국 내 한국계 커피전문점은 1천 곳이나 생겼다. 이는 미국계 스타벅스가 14년 걸려 달성한 기록을 훨씬 앞선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잘 되면 왜 굳이 중국으로 진출하겠느냐”며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이 포화상태로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푸드점과 빵집 등 외식업계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커피로 영역을 확장하는 점도 악재다. 이들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급속히 영역을 넓히고 있다. 프랜차이즈 아메리카노 커피 중 가장 저렴한 이디야가 2천800원, 스타벅스나 홀리스는 4천 원대인 데 반해 맥도날드는 1천500원, 파리바게뜨는 2천500원이다.
고급 커피, 디저트, 지방에 성장여력 남았다
이에 반해 아직까지 성장여력이 남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우선 커피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유력한 근거다. 실제 지난해 커피수입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원두와 조제품(분말) 등 수입량은 13만9천764t으로 전년 12만1천707t에 비해 14.8%나 늘었다.
서울 등 주요 도시를 피해 지방을 공략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대도시는 이견의 여지없는 포화상태지만 지방은 아직 목 좋은 곳들이 더러 남았다는 것이다.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지방으로 매장을 확대하는 움직임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면 커피전문점은 여전히 매력적 시장”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경쟁이 치열한 중저가 커피 대신 고급 커피로 차별화를 주문하기도 한다. 커피문화가 성숙해지면서 고품질 커피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스타벅스는 지난해 3월 첫선을 보인 고급 커피취급점 스타벅스 리저브를 최근 36개까지 확대했다. 엔제리너스는 지난해 11월 맞춤형 커피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매장 1호를 열었다.
커피에만 국한하지 않고 케이크, 샌드위치, 빙수 등 디저트 메뉴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일찌감치 디저트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이석구 대표는 “커피전문점 시장은 향후 3~4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그 이후엔 둔화되겠지만 적어도 5~10년간 한 자릿수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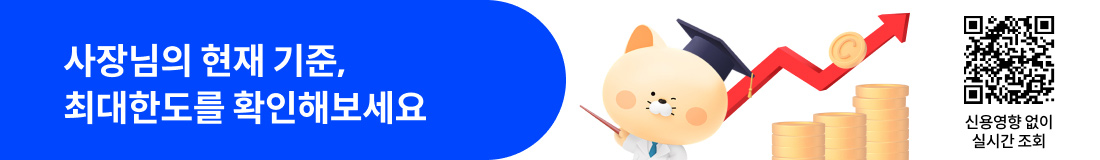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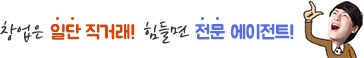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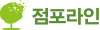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