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점주들만의 사정은 아닌가 봅니다.
점포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고 있노라면 불경기가 온 몸으로 느껴진다는 점주들 이야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색 바랜 동전을 모아 오는 손님, 안주 없는 술상을 봐달라는 손님, 외상값 떼어먹고 도망간 단골손님 등 그 모습도 가지각색인데요.
서울에서 두부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일주일에 한 번 가던 은행을 요즘엔 이틀마다 간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A씨는 “최근 10원짜리 50원짜리까지 탈탈 털어 와 두부를 사가는 손님이 늘었다”며 “손님 지갑에서 1000원 짜리라도 나올 땐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A씨는 동전을 세느라 손바닥이 까매집니다. 은행에 동전을 바꾸러 가면 은행직원은 A씨에게 “자판기 하시느냐”고 되묻는다고 합니다. A씨의 쓴웃음이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수원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는 “맥주 한 잔과 기본안주만 먹고 돌아서는 손님이 많아졌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나마 자주 찾아와 안주를 팔아주던 단골들도 이젠 가끔 어두운 얼굴로 들러 안주 없는 호프 한 잔만 마시고 일어선다는군요.
A씨와 B씨 같은 경우는 양호한 편입니다. 알뜰하게 소비하고 돌아서는 손님과 달리 몰지각한 행위를 서슴치 않는 손님도 상당수라는 게 일선 점주들의 목소립니다.
경북 문경에서 고기집을 운영 중인 C씨는 최근 겪었던 황당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C씨는 우시장 근처에서 고기를 사온 손님들에게 채소와 반찬을 제공하며 일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체 손님들이 경비를 아끼기 위해 테이블은 최대한 적게 쓰면서 반찬과 야채를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C씨는 “단체 14명을 받았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시비를 걸더니 1인당 1세트 씩 반찬을 줘야한다고 억지를 부리더라”며 “14명이니까 테이블 4개를 쓰면 될 것을 일부러 3개에 모여 앉아놓고 억지를 쓰니 누가 참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씨는 이어 “그 손님들 내보내고 하는 와중에 점포 입구에 뒀던 A급 사과 한 상자가 없어졌다”며 “밖에 나가 봤더니 그 일행 중 한 아줌마가 차에 싣더라”며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제적 금융위기가 이제 실물경제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도를 넘는 구두쇠 노릇보다는 점주와 손님이 서로를 이해하고 다독이려는 마음이 더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
다음글 새해 ‘창업시장에서 살아남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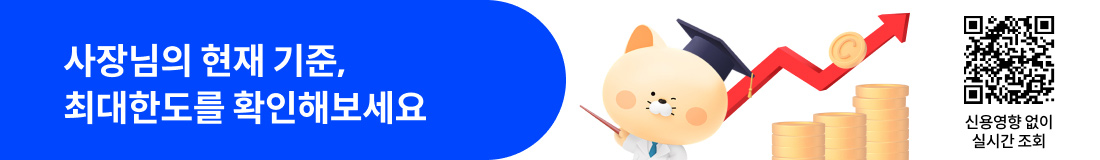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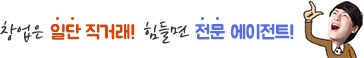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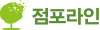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