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은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모두에게 악몽 같은 한 해였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창업 시장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상태.
창업자 중 80%가 2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구설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현실화 되면서 점포 매물은 쏟아졌고, 거래는 뚝 끊겼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온 점포거래에서도 양극화 조짐이 두드러졌다. 아주 싼 매물이거나 아주 비싼 매물만 겨우 거래됐다.
12월 들어서는 경기를 타지 않았던 10억대 특급매물도 권리금을 포기한 채 급매물로 나돌았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점포가 값 싼 점포와 매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태.
극도의 불황을 견디다 못해 문 닫는 점포가 늘어나면서 이를 맡아 처분하는 폐업 전문 업체와 중고물품 거래업체는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창업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도 극도로 식어 ‘창업’ 키워드 조회 수는 반 토막이 났다. ‘창업’ 키워드는 지난 10월 21일 11만 여건을 끝으로 10만 건 시대를 마감했다. 12월 24일 18시 현재 키워드 ‘창업’의 조회 수는 5만 8127여 건에 불과하다.
창업자들은 현상 유지를 위해 직원 수를 줄였고, 동시에 소비자들은 주머니를 닫은 악순환이었다. 위축될 대로 위축된 소비심리는 다양한 모습의 짠돌이 소비자를 양성하기도 했다. 각종 쿠폰은 기본이고 남은 음식을 싸 달라, 양을 줄여 주고 가격을 깎아 달라는 요구가 늘었다.
특히 경기를 많이 타는 번화가 주점의 경우 안주를 안 시키거나 간소화 하는 경향을 보였고, 단골의 경우에도 외상값을 남긴 채 발길을 끊는 사람이 늘었다고.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자 생계형 창업자들은 ‘가격파괴 마케팅’ 승부수를 띄웠다. 1000원 짜리 자장면, 1900원 짜리 돈가스 등 저렴한 단가로 무장한 점포들이 생존경쟁을 펼쳤다. 그러나 ‘상권 붕괴와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창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각종 ‘사기’였다. 특히 초보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아 피해가 컸다. 동업자로 접근해 투자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방송사를 사칭한 부당 광고료 징수, 허위 매물로 현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안정적 고수익’을 미끼로 창업자에게 접근하는 ‘불량 프랜차이즈’도 늘어났다. 상권분석에서부터 점포구입, 점포 운영까지 토탈 서비스 한다며 가맹자를 모은 뒤 가맹비만 챙겨 달아나는 일부 업체도 있었다고.
이처럼 불황은 점포거래 시장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 상처가 아물고 흉터로 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
이전글 [연말기획] 불황과 점포시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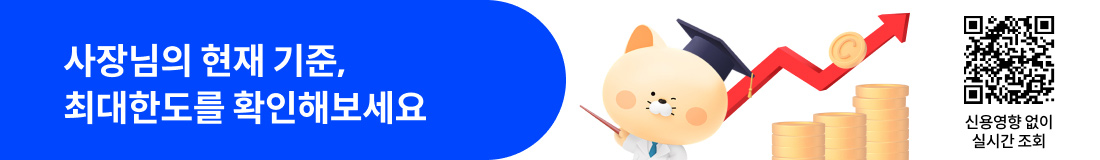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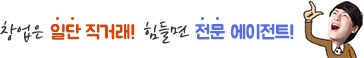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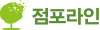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