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은 온통 안정성과 수익성에 쏠려 있다. 영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생소한 업종보다는 이미 수익성이 검증된 업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은 불황에도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자랑한다. 주변에 새로 창업한 점포를 보면 상당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서울에서 모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육류•해산물 무한리필 구이주점을 개업한 정 모씨(남, 48)는 장사가 잘 되는데도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다. 정 씨의 가게는 일 매출액이 평균 140만원 정도로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손님들이 순번 표까지 받아가며 기다리는 등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러나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을 바라보는 정 씨의 얼굴은 그다지 밝지 못했다. 재료 원가가 너무 높아 매출이 많아도 정작 순수익은 월 매출의 10%도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 씨가 사입하는 식자재 가격은 매출의 60%에 달하는 반면 주류매출은 매출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윤을 많이 남겨줘야 할 주류 매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원가 부담이 높은 구이에만 손님들이 달려들기 때문. 정 씨는 “부페 수익률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업한 것이 실수”라며 “가격을 천 원씩 올리거나 아예 업종을 바꿀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정 씨의 사례는 프랜차이즈 가맹으로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수익성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인 전형적 케이스다. 가맹본사에서 설명했던 수익률은 매출 대비 30%지만 실제 영업을 해보니 10%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업종이나 점포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리스크가 작으면 수익도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경향이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권장하고 싶지 않은 케이스가 종종 있다"며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다면 개인창업의 성공 확률이 더 높은 만큼 철저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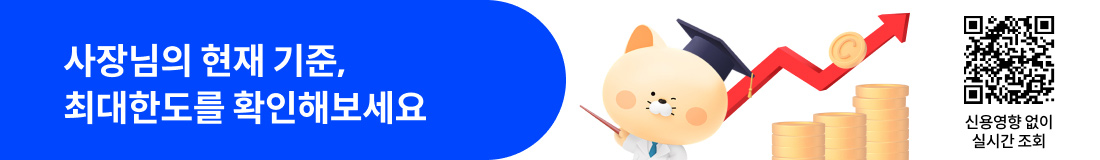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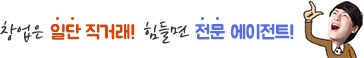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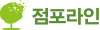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