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관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일제 강점기 ‘자릿세’가 이어져온 것이란 설도 있고, 6·25전쟁 직후 종로 시장통에서 먼저 좋은 자리를 잡은 상인에게 다른 상인이 “다 팔면 자리 좀 빌려 달라”며 ‘성의’를 표하던 데서 비롯됐다고도 한다. 이후 1960∼70년대 급속한 도시화로 상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관행화됐다.
굳이 나누자면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세분화된다.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입지의 가치를 말하고, 영업권리금은 이전 상인이 창출한 단골, 인지도, 신용, 영업 노하우 등의 값어치다. 시설권리금은 주방이나 테이블 같은 시설을 함께 넘겨받을 때 발생한다. 하지만 세 항목의 가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통상 뭉뚱그려 ‘권리금’으로 거래된다.
시설권리금은 노후 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고, 영업권리금은 대개 이전 상인의 1년치 순이익만큼 지불하는데 무슨 공식이 있는 건 아니다. 학원 권리금은 등록된 학생 수에 따라, 약국 권리금은 접수되는 처방전 수에 따라 매겨지곤 한다.
주택 전세금, 상가 보증금, 토지 매매금 등 부동산과 관련해 거래되는 돈은 모두 법에 규정돼 있다.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정부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권리금만 예외다.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개인 간의 사적(私的) 거래로 치부된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니 당연히 세금도 내지 않는, 우리나라의 독특하고 대표적인 ‘지하경제’다.
점포중개업체 ‘점포라인’이 지난해 1년간 매물로 등록된 서울의 점포 8191개를 조사한 결과 임대 보증금은 평균 5668만원, 권리금은 평균 1억2753만원이었다. 권리금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베이비붐 세대, 청년실업자 등의 자영업 점포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년보다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치킨집. 평균 1억7472만원으로 45%나 뛰었다. 반면 편의점은 27% 하락했다.
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수천만∼수억원이 오가고 자영업자 대부분이 그 거래에 얽혀 있는데 법은 외면하다 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권리금 거래는 황금시장이 됐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중개업자가 건물주를 꼬드겨 임차인을 쫓아내고 그 권리금을 나눠 갖는 경우도 많다”며 “불법도 아니고 세금도 안 내는 수입이라 1년에 한두 건만 해도 엄청 수지맞는 장사”라고 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도 결국 권리금 때문이었다. 용산 재개발로 건물이 헐리게 되자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임차상인들이 점거 시위를 벌였고 경찰 진압 과정에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권리금 폭탄’이 생명까지 앗아간 이 사건은 1주일 뒤면 발생한 지 꼭 5년이 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시절인 2012년 1월 서울경제신문에 ‘상가권리금 법제화 서두르자’란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다. 서 장관은 “용산참사 후 3년이 지났지만 권리금 문제를 입법화하겠다던 국회가 한 일은 영업손실보상금 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 게 유일하다”며 “서민을 끔찍이도 위한다는 여야 모두가 한 일 치고는 무척 초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상액 현실화, 강제퇴거 금지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소유권이 보장되듯 권리금도 같은 차원에서 보장되는 게 마땅하다”며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서민들에게 빈말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애정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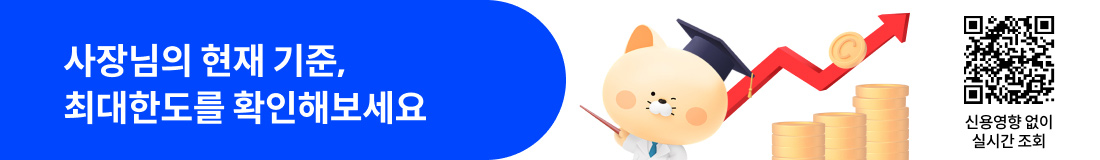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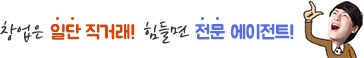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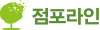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