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고생이란다. 그런데 그 고생이 인건비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일보>는 지난 25일, '자영업자의 눈물' 기획의 일환으로 "벌이는 월급쟁이보다 못한데 준수의무는 기업가 수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노동자의 인건비가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의무인 것처럼 묘사했다.
제목에 나오는 '의무'는 기사 본문에 총 2번 나온다. 전부 '인건비' 관련 문단이다. 심지어 서두에서 '주휴수당'을 요구한 직원을 마치 사장을 '배신'한 것처럼 묘사했다.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기 전 3개월마다 갈아치우는 사장을 정당화해주었다. 심지어 1주일에 15시간 일하면 누구에게나 지급해야만 하는 주휴수당을 "큰 기업체에서나 줄 것 같은"이란 형용사를 붙여가며 '호의'의 문제인 것마냥 치부했다.
자영업자가 눈물 흘리는 이유는 '인건비'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기사가 잘못된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 마냥 그렸다는 점이다. 점포 거래 전문업체 <점포라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의 자영업 점포의 평균 인건비는 242만 원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17.1%(50만 원)이 줄어든 결과이며, 2010년(303만 원) 이후 최저 수치다.
그에 비해 평균 월세는 2010년 이후 최고 수치인 324만 원에 달했다. 작년에 비해 수도권 점포 매물 거래 등록 개수가 10% 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짐은 인건비가 아니라 점포 월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9월 24일, "자영업자의 큰 애로 중 하나가 상가 권리금 문제, 임차 간 문제"라고 밝힐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으로 직결된다. OECD 평균(6.44달러)의 50%에도 못 미치는 현실(3.12달러)까지 고려하면 인건비가 결코 자영업자의 눈물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00만 명이 넘는다.
<국민일보> '자영업자의 눈물'은 기획 기사다. 이 제목을 달고 나온 25일자 기사는 총 3개였다. 다른 기사들은 각각 "시간제 일자리 만들면 최대 960만 원 지원", "정부의 탁상행정 자영업자 더 울린다"라는 제목으로 자영업 지원책과 정부의 탁상행정을 이야기한다. 제목은 자영업자의 눈물이라지만 그 눈물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흘리는지 어느 기사도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경쟁자가 너무 많은 레드 오션, 경기 침체의 만성화 등 자영업자를 눈물짓게 하는 원인은 거르고 난 데 없이 인건비를 걸고 넘어졌다. 심지어 실효성에서 의문을 받은 '시간제 일자리'를 권장하기까지 한다.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법
모든 자영업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일부 자영업자들은 꽤나 잘못된 행태를 보인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퇴직금을 모아 창업을 한다. 예상에 비해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지킬 것 다 지켜가며 돈을 버느냐"라고 면박을 주기 일쑤다.
몇몇 악덕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하기 싫으면 관둬"라고 말한다. 이 말을 반대로 돌려주고 싶다. 악덕 자영업자들도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못 줄 것 같으면 "사업을 그만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수익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노동가치가 소중한 것만큼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가치도 소중하다. 노동의 가치를 언급하는 게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회의 발전 그 기저에는 항상 노동이 있다. 그릇된 가치관으로 노동을 폄하하는 언론이나, 약자의 입장에서 더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부디 땀 흘리고 무언가를 만드는 생활의 가치가 더 이상 폄하받지 않기를 바란다. 인건비는 '당연'한 노동의 대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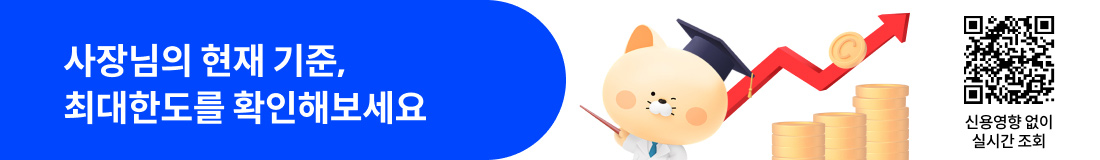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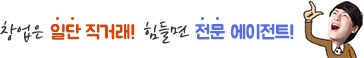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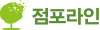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