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좋지 않으면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이 저가다.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반드시 수요가 늘어나는가? 그런 품목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 이는 가격의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시장에서는 이런 민감한 부분을 따져 보지고 않고 그저 싸면 판매량이 늘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가 정책을 생각한다.
저가정책에도 함정이 있다. 지금부터 그 함정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가격을 내리면 판매량은 는다. 판매량이 늘면 매출은 오른다. 매출이 오르면 수익도 늘어난다. 이 공식에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
내린 가격 만큼의 매출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팔아야 하는 숫자가 나온다. 우선 그것이 가능한 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5,000원 짜리 국밥을 하루에 100그릇을 팔았다. 그러나 국밥을 3,000원으로 내릴 경우 단순 계산으로는 170그릇을 팔아야 한다. 2,000원을 내리면 70그릇이 더 팔릴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원가 부분을 생각해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밥 한 그릇의 순수 원가를 20%로 보면 5,000원 일 때는 매출이익이 4,000원인데, 3,000원 일 때는 2,000원이 된다. 결국 100그릇 팔면 40만원 그리고 170그릇을 팔면 34만원이 매출 이익이 된다. 오히려 손해다. 여기에 전기세, 가스, 기타 소모품의 추가 비용을 계산하면 손님은 많아도 결국은 손해라는 계산이 나온다. 더군다나 170그릇을 팔기 위해 직원을 한명 더 채용을 하는 경우는 손실을 더 크다.
저가정책이 불황기에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위에서 든 예는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 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가격을 내릴 때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정성적인 측면에서 결정을 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상품 중에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상품이 있다. 이런 상품을 취급할 경우는 가격을 내리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영업시장에서는 수익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가 판매는 자칫 손님이 많아서 기분은 좋은데, 힘만 들고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결론에 도달 할 수도 있다.
불경기에 가격을 올리는 곳도 있다. 분당 KT 본사 맞은 편 정자동 먹자 상권은 소문난 곳이다. 한 때 이곳은 장사하는 곳마다 돈을 벌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실속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매출이 줄자. 이곳 상인들은 모임을 통해 가격을 현실적으로 받자면서 오히려 2-30% 올렸다. 점심 메뉴가 최하 6천원에서 9천원이다.
이 결정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저올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어떨지는 두고 볼일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소비자들은 이성 소비를 하게 마련이다. 즉 필요성을 느낀다면 반드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은 줄겠지만 전체 매출의 감소 폭은 줄일 수 있으며, 운영비 부분이나 원가 절감 측면을 감안하면 더 효과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저가정책보다는 고가정책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것이 현명하며, 저가 정책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리라는 말이다. 불황 탈출의 비상구가 가격 외에는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 답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도움말=이타창업연구소 김갑용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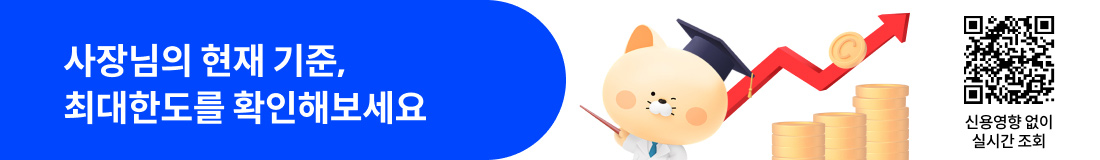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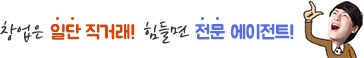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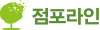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