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사는 장모(43)씨는 최근 동네의 한 상가에서 영업 중인 냉면집을 인수했다. 장씨는 건물 임대료 외에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넸지만 따로 권리금계약서를 쓰진 않았다. 그는 “주변에서 계약서를 쓰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해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리금은 해당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 등 유형재산과 매출 규모 등 무형재산에 대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다. 당연히 장사가 잘되는 상가(자리)일수록 비싸다. 그래서 ‘자릿세’라고도 한다.
그러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건넨 상가 임차인 10명 중 9명은 권리금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가(점포) 10실 중 7실에는 권리금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상가 권리금 현황을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권리금 법제화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 5개 업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부동산임대업·여가관련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내 표본 8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9주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국 평균 권리금은 4574만원이다. 권리금이 가장 비싼 곳은 광주광역시의 음식점·모텔 등 숙박음식점업으로 평균 6956만원에 달했다. 대구의 노래방·스크린골프장 등 여가관련서비스업(6808만원)과 서울의 숙박음식점업(6421만원), 서울의 여가관련서비스업(6251만원)도 평균 6000만원이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5400만원으로 1위였고, 광주(4851만원)·대전(4302만원)·인천(4189만원)·대구(3944만원)·부산(3913만원)이 뒤를 이었다. 울산은 평균 2619만원으로 조사 대상 지역 중 가장 저렴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5531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미용실·세탁소 등 개인서비스업은 2906만원에 그쳤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권리금이 비싸다는 건 그만큼 장사가 잘되고 수익이 많이 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권리금은 조사 대상 상가 10곳 중 7곳(70.3%)에 형성돼 있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88.8%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60.6%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권리금 거래 때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11% 수준에 그쳤다. 계약서 작성 비율은 대구가 27.2%로 높은 편이었지만 광주는 4.6%에 불과했다.
권리금계약서 작성 비율이 떨어지는 건 이번 조사 시점이 지난해 권리금 법제화 직후인 10월이었던 데다 이미 2~3년 전에 권리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전문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엔 권리금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권리금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권리금계약서 작성을 유도한 만큼 이후 조사에선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권리금계약서 작성이 강제사항이 아닌 데다 계약서 자체에 법적인 효력이 없어 여전히 시장에선 외면받고 있다. 상가거래전문회사인 점포라인의 이동원 팀장은 “지난해 5월 이후 권리금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상당수 임차인이 계약서 쓰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권리금계약서가 권리금 거래를 증빙하는 자료인 만큼 써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동인의 최종모 변호사는 “개인 간 거래인 만큼 계약서 작성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주택 실거래가 신고처럼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조항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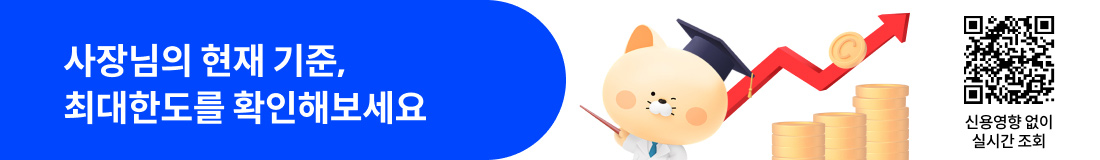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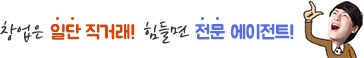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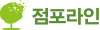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