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임금 근로자 지표가 19년 만에 700만명 이하로 감소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임금 근로자 수는 685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에 비해 19만4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이 수치가 700만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1991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비임금 근로자 수는 1991년 695만명을 기록한 후 2002년 798만8000명을 기록하는 등 지금까지 70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91년 37.3%에서 지난해 28.8%로 8.5%p 감소했다. 이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비임금 근로자의 감소가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봤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되며 이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75%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자영업의 몰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국에 비해 경제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 간 치열한 경쟁이 상존했고 이에 따라 창업과 폐업이 높은 빈도로 되풀이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계속 유지해왔다.
이 같은 경쟁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한 점포는 오히려 고객 수가 늘고 수익성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업종이 2년 전 창업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당구장이다. 당구장은 98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PC방에 밀려 사양길을 걸었고 5년도 채 안돼 점포 수는 반토막 난 바 있다.
하지만 살아남은 당구장들은 승자의 여유를 맘껏 누렸다. 당구 인구가 여전한데다 경쟁점포 수가 줄면서 내점객 수가 자연스레 증가했고 이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 당구장 창업 희망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자영업자 수나 비임금 근로자수의 감소도 큰 맥락에서는 이같은 현상과 상통한다. 자영업자 수가 줄면 줄수록 자영업자들의 영업 여건은 좋아질 여지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일선 자영업은 시장 논리가 철저히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싸고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홍 팀장은 '단순히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것만으로 자영업의 위기를 논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전체 자영업자의 실제 매출이나 수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임금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것이 자영업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다 실질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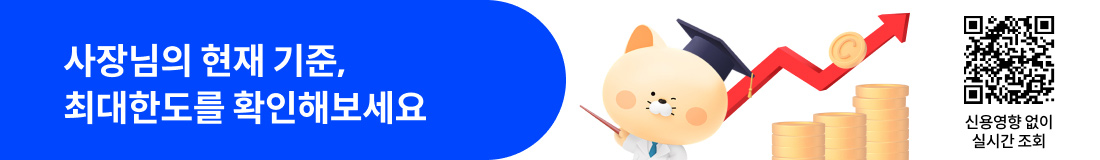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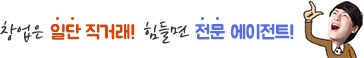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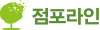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